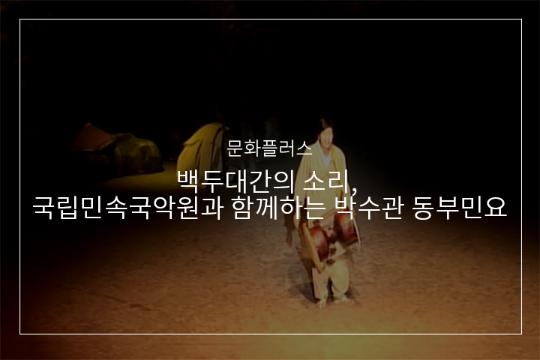-
다른 이름
장타령패, 장타령꾼
-
정의
-
요약
각설이패는 집집 문전을 찾아가거나 거리나 장터에서 〈각설이타령〉을 부르며 흥을 돋우거나, 웃음 혹은 동정심을 유발하는 흉내 내기나 몸짓으로 상대방의 감성을 자극하여 돈이나 음식을 얻어 내는 사람이다. 단독으로 혹은 소규모의 집단을 지어 이동하며, 조선 후기부터 활동한 유랑 예인 집단으로 하층민 출신들이 모여 형성되었다. 이들은 즉흥적인 노래와 추임새, 몸짓을 결합한 대중 친화적인 형식으로 공연을 펼쳤고, 〈각설이타령〉의 가사에는 자신의 출신 성분을 드러내며 신분 반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오늘날에는 〈각설이타령〉의 후렴 장단인 ‘품바’를 축제장이나 광장에서 하는 공연 양식의 명칭으로 쓰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
유래
각설이패는 단순히 말이나 몸짓으로 구걸하는 거지와 달리, 노래인 〈각설이타령〉을 중심으로 연희를 펼치며 대가를 받는 유랑 예인 집단으로 형성되었다. 문헌상으로는 『신재효 판소리 사설집』의 〈박타령〉과 〈변강쇠가〉에서 각설이패 혹은 장타령꾼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며, 『삼국유사』의 조신 설화에서는 구걸 장면이 묘사되지만 연희적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세조실록』에서는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가 ‘악기를 타며 구걸하는 자’에 대해 정착 정책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는 음악을 수단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유랑인의 존재를 보여 준다.
-
내용
○ 조직과 운영
각설이패는 유랑하며 걸식하는 예인 집단으로, 재인 광대 출신이나 몰락한 양반, 소외된 지식인, 민간의 노비, 유랑 농민, 천민 계층 등 다양한 하층민들이 모여 형성되었다. 이들은 단독으로 혹은 소규모 집단을 이루어 이동하며, ‘패’를 구성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공연의 규모를 키우며 상호 의존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 활동 내용
각설이패는 장터와 거리, 잔칫집과 초상집, 집집마다 문전을 돌아다니며 〈각설이타령〉 또는 〈장타령〉을 부르며 흥을 돋우고, 웃음이나 동정심을 유발하는 몸짓과 흉내 내기로 청중의 감성을 자극하여 음식이나 돈을 얻었다. 이들의 공연은 단순한 걸식이 아니라 오락적 흥겨움과 축원의 의미를 담은 노래로 구성되며, 추임새와 과장된 동작을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즉흥적인 가사로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하였다. 특히 〈각설이타령〉의 가사에는 각설이 자신의 출신 성분을 밝히며, 거지 행색만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신분 역전의 반전 드라마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역사적 변천
조선 후기에는 판소리꾼, 풍각장이패, 남사당패 등 다양한 유랑 예인 집단이 등장하며, 각설이패는 이들과 함께 음악과 몸짓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생계를 유지하는 예인으로 자리잡았다. 『신재효 판소리 사설집』의 〈박타령〉과 〈변강쇠가〉를 통해 각설이패의 활동 양상을 엿볼 수 있으며, 〈박타령〉에서는 각설이패가 장터 지명을 나열하며 흥을 돋우고, 〈변강쇠가〉에서는 세 명이 한 조가 되어 송장을 처리하는 장면이 묘사된다. 1960년대까지도 전국 각지를 떠도는 각설이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농촌 변두리나 도회지의 다리 밑, 산자락 등에 공동체를 형성하며 집단 생활을 이어 갔다. 그러나 점차 자유롭게 구걸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문전이나 거리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졌고, 1977년에는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면 의산리에 ‘천사촌’이라 불리는 각설이 집단 거주지가 존재하며 〈각설이타령〉을 활발히 전승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설이패는 ‘품바’라는 이름으로 축제 공연 양식으로 재등장하였고, 품바는 각설이타령의 추임새에서 유래한 용어로, 1980년대 대학로에서 시작된 창작극 ‘품바’가 대중적 인기를 끌며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품바 공연은 짙은 화장과 울긋불긋한 의상, 우스갯소리와 몸짓을 통해 관객에게 웃음을 주는 형식으로 발전하였으며, 충청북도 음성군의 음성 품바 축제와 전라남도 무안군의 무안 각설이 품바 전수관 설립 등 지방 정부 주도의 축제로 정착되었다. -
의의 및 가치
각설이패는 체면과 품위를 내려놓은 자리에서 삶의 고단함을 해학으로 승화시킨 민중 예술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적 소외와 빈곤을 웃음과 흥으로 풀어내며, 공동체의 정서에 다가가는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였다. 각설이타령은 단순한 유희를 넘어, 시대의 관심사와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즉흥적 표현의 장이었으며, 품바로 이어진 공연 양식은 전통 연희의 현대적 변용이자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연행은 예술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려는 집단적 몸짓이자, 민중의 삶을 대변하는 상징적 언어로서 그 가치를 지닌다.
-
참고문헌
강은해, 「각설이타령 원형(原型)과 장(場)타령에 대한 추론(推論)」, 『국어국문학』 85, 1981.
박전열, 「각설이타령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박전열, 「전통연희집단의 계통과 활동」, 『연희, 신명과 축원의 한마당』, 2006.
장성수, 「각설이타령의 담당층과 구조 연구」, 『문학과 융합』 16, 1995. -
집필자
박전열(朴銓烈)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