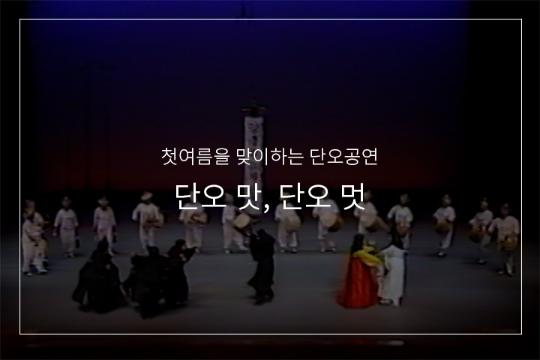-
정의
강원도 강릉지방에서 단오에 연행되는 탈춤
-
요약
강릉관노가면극은 강원도 강릉지역의 《단오제》에서 관아에 소속된 노비인 관노(官奴)들에 의해 연행되었던 가면극이다. 원래 음력 5월 1일 대성황당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시작으로 4, 5일간 마을 곳곳에서 가면극 연희가 진행되었다. 제1과장 〈장자마리춤〉, 제2과장 〈양반광대ㆍ소매각시춤〉, 제3과장 〈시시딱딱이춤〉, 제4과장 〈소매각시 자살과 소생〉의 구성이며 연희자들의 대사나 노래가 없는 무언극 형태인 것이 한국의 다른 지역 가면극과 다르다.
-
유래
강릉관노가면극의 정확한 기원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광해군(光海君, 1608~1623 재위) 때 편찬된 허균(許筠)의 문집에서 《단오제》를 구경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단오제》에서 연행된 강릉관노가면극 역시 그 유래를 17세기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볼 수는 있겠다. 남효온의 『추강선생문집(秋江先生文集)』(1477)에는 동해안지역의 산신제가 언급되었는데, 강릉의 《단오제》가 동해안지역의 대표적인 산신제인 점으로 보아, 이 때 추었던 탈춤 역시 오랜 역사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던 강릉관노가면극은 1960년대에 복원이 시도되었으며, 1967년에 《강릉단오제》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면서 오늘날까지 《단오제》에서 연행되고 있다.
-
내용
○ 역사 변천 과정
강릉관노가면극이 언제부터 연행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1910년까지 지속적으로 연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될 뿐이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전승이 중단된 바 있지만, 1960년대에 학자들의 노력과 1900년대까지 실제로 가면극에 참여했던 김동하(1984~1976), 차형원(1890~1972) 등의 제보를 토대로 복원이 이루어졌다. 1965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여하였고, 이후 여러 단체에 의해 연희된 바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강릉관노가면극보존회가 조직되어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음악적 특징
강릉관노가면극의 반주악기로는 꽹과리, 북 , 장구, 징 등의 타악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질꼬내기(길군악), 굿거리, 삼채 등의 장단이 연주된다. -
절차와 구성
○ 절차
《강릉단오제》의 본제가 시작되는 음력 5월 1일부터 강릉관노가면극을 놀기 시작했다. 강릉관노가면극은 제1과장 〈장자마리춤〉, 제2과장 〈양반광대ㆍ소매각시춤〉, 제3과장 〈시시딱딱이춤〉, 제4과장 〈소매각시 자살과 소생〉으로 구성된다.
< 장자마리춤. ©국립무형유산원 >
서사적인 내용의 연희가 연결된 구성이라는 것이 각 과장의 내용이 서로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다른 지역 가면극과의 차이점이다. 첫 번째 과장인 〈장자마리춤〉은 벽사적 의식무의 성격을 띠기도 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성격을 띠기도 한다. 〈양반광대ㆍ소매각시춤〉 과장과 〈시시딱딱이〉 과장은 양반과 소매각시의 사랑, 그리고 시시딱딱이들이 이를 훼방 놓는 내용이다. 마지막 〈소매각시의 자살과 소생〉 과장은 양반이 시시딱딱이와 놀아났다고 소매각시를 나무라고, 이에 억울해하는 소매각시가 자살하자 장자마리들과 시시딱딱이가 서낭신에게 빌어서 소매각시가 다시 살아나는 내용이다.
< 양반광대, 소매각시, 시시딱딱이. ©국립무형유산원 >
이렇게 소매각시가 다시 살아나면서 끝나는 것은 다른 가면극에서 영감과의 갈등, 또는 처첩간의 갈등 속에서 등장인물이 죽고 끝나는 것과 구분되는 점이다.< 강릉단오제 ©국립무형유산원 > ○ 악곡 구성
연희자들의 춤 반주음악에는 굿거리 ⇨ 굿거리장단, 삼채 ⇨ 굿거리장단 등의 장단이 사용되며 이러한 장단에 맞춰 추는 춤사위로는 〈기본사위춤〉, 〈마당닦기춤〉, 〈직선사위춤〉, 〈맞춤〉, 〈너울질춤〉, 〈회돌이칼춤〉, 〈어르기춤〉, 〈가세치기〉, 〈고개치기〉 등이 있다. 1965년 강릉관노가면극의 복원 이후 장자마리의 ‘〈마당닦기춤〉’, 양반광대의 ‘〈직선사위춤〉’, 양반광대와 소매각시가 어울려서 추는 ‘〈맞춤(對舞)〉’과 ‘〈어깨춤〉’, 시시딱딱이의 ‘〈너울질춤〉’ 등 독자적인 춤사위가 복원된 바 있다. -
의의 및 가치
강릉관노가면극은 《본산대놀이》계통과 《마을굿놀이》계통으로 나뉘는 한국의 가면극 구분상으로 볼 때 《마을굿놀이》계통에 속한다. 《마을굿》 속에 포함되어 연행되어 온 가면극을 《마을굿놀이》계통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전승 지역의 토속적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강릉관노가면극의 반주 악기가 타악기 중심인 점 역시 《마을굿》에 동원되는 풍물패가 가면극 연희에 참여하면서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노가 탈춤에 관여했던 점은 전국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강릉관노가면극이라는 명칭에 ‘관노’라는 용어가 남아있는 것은 관노가 연희주체자였던 시기에 해당 탈춤 전승이 단절되어 버렸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
지정사항
강릉단오제: 국가무형문화재(1967)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2005) -
참고문헌
강릉단오제보존회, 『강릉관노가면극 전수교본』, 해람기획, 2000.
국립문화재연구소, 『강릉단오제』, 1999.
장정룡, 『강릉관노가면극연구』, 집문당, 1989.
이보형, 「강릉관노가면희」,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강원편, 문화재관리국, 1977. -
집필자
임혜정(林慧庭)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