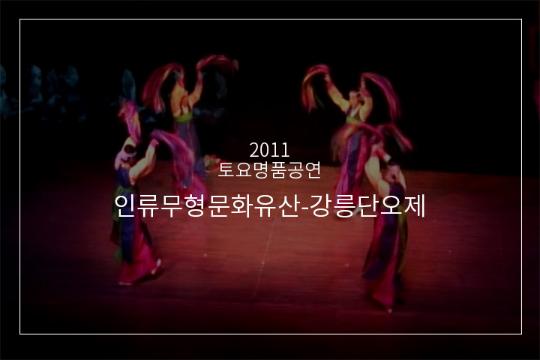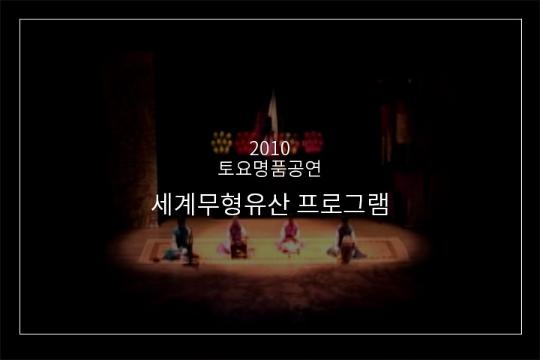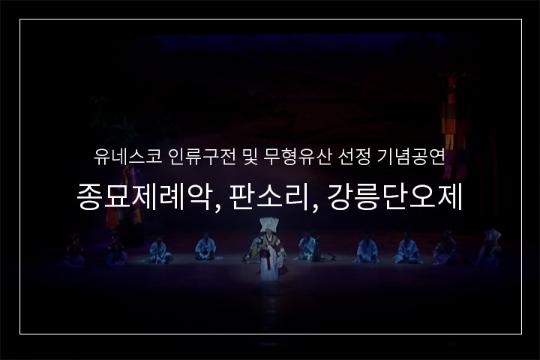-
다른 이름
단오굿(端午-), 단양절(端陽節)
-
정의
대관령 신앙을 바탕으로 단오 시기에 전승하고 있는 강릉의 전통 축제.
-
요약
강릉 단오제는 강릉에서 해마다 단옷날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축제이다. 대관령 국사성황(大關嶺國師城隍)과 대관령 국사여성황(大關嶺國師女城隍), 대관령 산신(大關嶺山神)을 모시고 제례, 무당굿, 탈놀이를 하며 남대천 단오장에서는 각종 민속놀이와 문화 행사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난장이 벌어진다.
-
유래
강릉 단오제는 고려 건국 시기에 지리적으로 중요해진 대관령 신앙을 바탕으로 유래한 것으로 짐작된다. 행정의 중심지가 경주에서 송도로 바뀌어 영동과 영서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한 길이 바로 대관령이다. 『고려사』「열전」에는 935년(태조 18년) 강릉 출신 왕순식(王順式, ?~?)이 왕건(王建, 877~918)을 도와 신검을 토벌하러 갈 때 대관령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대관령 신앙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에서 전승하고 있는 산신제에 관한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기록이 있다. 남효온은 『추강선생문집(秋江先生文集)』에서 영동 민속을 소개하였는데 해마다 3ㆍ4ㆍ5월 중에 날을 가려 음식을 장만하여 무당과 함께 산에 올라가 3일 동안 산신제를 지낸다고 하였다. 단오제를 언급한 내용은 아니지만 시기가 비슷하고 무당굿으로 산신을 제사 지낸다는 점에서 상통하는 바가 있다.
-
내용
○ 개요 강릉 단오제는 대관령 국사성황, 대관령 국사여성황, 대관령 산신 신앙을 바탕으로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전통 축제이다. 단오를 중심으로 대관령을 오가며 영서 지역과 교류하던 강릉과 영동 지역민들의 안과태평(安過太平)과 풍농을 기원하려는 목적으로 행사를 했다. 1603년 허균(許筠, 1569~1618)은 강릉 단오제를 직접 보고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 기록을 남겼다. 강릉 사람들이 5월 초하룻날 번개(幡蓋)와 향화(香花)로 대령신을 맞이하여 명주(현 강릉)부사에 모신다고 했다. 대령신은 김유신(金庾信, 595~673) 장군인데 5일에는 잡희로 신을 기쁘게 하고 하루 종일 괫대(幡蓋)가 쓰러지지 않으면 풍년이 들고, 쓰러지면 반드시 바람과 가뭄의 피해가 있었다고 신의 영험함도 전했다. 오늘날 강릉 단오제의 내용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기록은 향토지 『증수임영지(增修臨瀛誌)』에 남아 있다. 해마다 4월 15일에 호장이 무당을 거느리고 대관령 신사에 가서 고유하고 무당이 나무에 신을 내리게 한다는 것이다. 신이 내려 저절로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꺾어 모시고 내려오는데 이를 국사행차라고 했다. 신목은 관사에 모셔 두고 단옷날이 되면 화개를 만들어 잡희를 하다가 다음날 성황사에서 신목을 불태운다고 하였다. 이 행사를 하지 않으면 비와 바람이 곡식에 피해를 주고 짐승의 피해가 있다고 믿었다. 이 기록은 향리와 무당,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성황제로 현재 전승하고 있는 강릉 단오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강릉 단오제는 일제 강점기 시대를 거치면서 중앙시장 상인이 중심이 되어 남대천에서 벌이는 난장 형태로 전승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67년 강릉 단오제가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당시에는 강릉시가 행사를 주관했으나 1973년 강릉문화원으로 이관되었다. 2005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된 이후 2007년부터 (사)강릉단오제위원회가 축제를 주관하고 있다. (사)강릉단오제보존회는 지정 종목인 제례, 단오굿, 가면극을 전승하고 강릉시는 해마다 임시로 설치하는 단오장의 설비를 맡고 행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강릉 단오제는 단오를 중심으로 한 달 이상 진행되고 공간은 신앙의 핵심인 대관령부터 강릉 시내까지 이어져 매우 넓다. 음력 4월 5일 신주를 빚은 뒤, 4월 보름 대관령으로 올라가 국사성황 신위와 신목을 모시고 내려온다. 대관령 국사여성황사에 모셔 두었던 국사성황 신위와 신목은 음력 5월 3일 강릉시내를 관통하는 남대천변의 가설굿당으로 모셔 낸 후 5월 8일까지 제례와 무당굿을 한다. 그동안 남대천 단오장에서는 관노 가면극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속놀이와 행사가 벌어지고 대규모의 난장이 선다. 8일 저녁 송신제를 올린 후 신위와 신목, 굿당의 장식물 등 신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태우는 소제로 마친다.
○ 내용과 구성 1. 신주빚기 : 단오제를 시작하는 행사로 음력 4월 5일에 한다. 강릉부사가 신주미와 누룩을 하사했다는 전승에 따라 강릉시장이 쌀과 누룩을 바친다. 신주는 조선조 관청이었던 칠사당에서 빚는데 무당이 부정굿과 축원굿을 한다. 2. 대관령 산신제와 국사성황제, 신목 모시기 : 음력 4월 15일에 한다. 제관들과 무당패, 시민들이 제물을 장만하여 대관령에 올라가 먼저 대관령 산신에게 제사를 지낸 후 성황사로 옮겨 신라말 고승 범일국사(梵日國師, 810~889)라고 알려진 대관령 국사성황에게 제사를 지낸다. 무당이 부정굿과 서낭굿을 한 뒤에 신장부가 산에 올라가 신목을 찾는다. 신장부가 선정한 단풍나무에 무당이 축원하여 신이 내리면 그때부터 신목은 대관령 국사성황을 상징하는 신체가 된다.
< 강릉 단오제 대관령 신목 모시기 ©황루시 >
신목과 국사성황 신위를 모신 일행은 구산 서낭당과 학산 서낭당을 거쳐 강릉시내에 있는 국사여성황사로 온다. 대관령 국사여성황은 호환에 간 정씨 여인이라고 믿는데 봉안제와 굿으로 대관령 국사성황을 이곳에 좌정시킨다. 신위와 신목은 단오제 본제가 시작되는 5월 3일까지 국사여성황사에 안치한다. 3. 영신제와 영신행차 : 5월 3일 저녁에 국사여성황사에서 영신제로 시작한다. 제례를 마치면 남녀성황의 신위와 신목을 모시고 남대천 강변 단오장에 마련한 가설 굿당으로 간다. 중간에 잠깐 여성황 생가에 들러 굿을 한 뒤에 영신행차 일행은 수많은 시민의 호위를 받으며 단오장으로 간다. 가설굿당에 신위와 신목을 모셔두고 무당은 문굿과 청좌굿을 한다. 5월 4일부터 8일까지 단오장에서는 제례, 무당굿, 탈놀음 등 지정 문화유산 행사를 비롯하여 각종 민속놀이가 벌어진다. 4. 조전제: 매일 아침 유교식 제례인 조전제를 한다. 조전제에는 강릉시장을 비롯한 단체장들과 유지들이 헌관으로 참여한다. 5. 무당굿 : 조전제가 끝난 뒤 저녁까지 이어지는 무당굿은 강릉 단오제 신앙의 핵심이다. 굿의 내용은 부정굿, 하회동참굿, 조상굿, 세존굿, 산신굿, 천왕굿, 군웅굿, 심청굿, 칠성굿, 지신굿, 손님굿, 용왕굿, 제면굿, 꽃노래굿, 뱃노래굿, 등노래굿, 대맞이굿, 환우굿이다.
< 강릉단굿당의 무당굿(세존굿) ©황루시 >
여기에 양중들이 하는 연극으로 세존굿에 따르는 중잡이놀이, 천왕굿에 이어지는 곤반놀이와 독립적으로 연행하는 탈굿이 있다. 무당굿은 무당의 노래와 서사시 구연, 춤, 반주 음악, 촌극 등으로 구성되는 종합 예술이다. 집안으로 대를 이어 내려온 세습무를 주축으로 구성된 무녀와 양중이 연행한다. 지모, 무당각시라고 부르는 무녀는 무가 구연과 춤을 추면서 실제 사제 역할을 한다. 화랭이, 또는 사니라고도 부르는 남자는 타악기로 된 무악을 반주하고 지화 제작과 연극 등을 맡는다. 세습무 전승이 단절의 위기를 맞고 있는 최근에는 제도 교육 출신의 젊은 국악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신구(新舊) 세대가 함께 굿을 하고 있다. 6. 관노 가면극: 조선조 관노들이 연행했기에 관노 가면극이라고 부르는 탈놀이는 단오제 기간에만 공연되었던 무언극이다. 20세기 초 조선조 패망과 함께 전승이 중단되었으나 1967년 국가 무형문화유산 지정 과정에서 복원되었다. 초대 관노 가면극 예능 보유자가 된 김동하(金東夏, 1884~1976), 차형원(車亨元, 1890~1972)의 인터뷰를 통해서 극의 내용과 인물, 탈의 모습과 복식 등을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등장인물은 양반광대, 소매각시, 장자마리 2인, 시시딱딱이 2인, 악사들이다. 양반광대는 원뿔 모양의 관을 쓰고 긴 수염을 달았다. 회청색 천을 뒤집어쓴 장자마리는 ‘보쓴 놈’이라고도 부르는데 배불뚝이 모습으로 몸에는 해초와 곡식줄기를 매달았다. 시시딱딱이는 험상궂은 모습으로 손에는 칼을 들었다. 인물의 연원에 대해서는 나례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과 강릉 지역 서낭당에서 모시는 서낭신, 토지신, 여역신의 인격화라는 설이 전한다. 양반과 각시는 남녀 서낭신(城隍神), 장자마리는 토지신(土地神), 시시딱딱이는 여역신(癘疫神)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견해이다. 또한 가면극을 할 때는 반드시 화개(花蓋)를 앞세웠는데 화개는 움직이는 신간의 역할을 하여 탈놀이의 신성성을 담보한다. 놀이는 다섯 마당으로 구성된다. 첫째 마당에서는 화개를 앞세우고 모든 인물과 악사들이 등장한 뒤 장자마리가 놀이마당을 연다. 둘째 마당은 양반광대와 소매각시가 만나 사랑을 나눈다. 셋째 마당은 시시딱딱이가 등장하여 둘의 사랑을 방해하고 소매각시를 빼앗아간다. 넷째 마당은 정절을 의심받은 소매각시가 양반의 수염에 목매달아 자살하는 소동을 벌인다. 다섯째 마당은 양반이 화개에 잘못을 빌자 죽은 척하던 소매각시가 살아나고 다 함께 화해하는 내용이다. 다른 지역의 탈놀이에 비해 내용이 단순하고 신분 갈등이나 풍자의 강도가 약한 편이지만 원초적인 서낭굿 탈놀이로서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 관노 가면극 현장 ©황루시 >
7. 송신제와 환우굿, 소제: 5월 8일 저녁 송신제를 한 뒤에 무녀가 신목을 내려 그동안 신이 모든 제사를 즐겁게 받으셨는지를 묻는 대내림을 한다. 신목과 신위, 굿에 사용했던 지화와 장식물들을 모두 태우는 것으로 단오제를 마친다.
강릉 단오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정 종목인 제례, 무당굿, 가면극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대천 가설단오장은 지정 종목 외에 강릉 농악, 학산 오독떼기, 하평 답교놀이 등 다양한 민속 연희와 공연, 단오 민속 체험, 음식과 물건을 파는 거대한 난장이 있어 신명나는 전통 축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무형유산이다.
○ 음악적 특징 무당굿은 타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무가와 춤으로 구성된다. 무녀가 부르는 무가는 고도의 음악적 숙련 과정을 거쳐서 노래와 말, 적절한 몸동작과 춤으로 사설을 엮어 나가는 원리를 터득한 이후에 구연이 가능하다. 악기는 장구, 징, 꽹과리, 바라를 사용하고 호적을 불기도 한다. 푸너리장단은 모든 굿을 시작할 때 연주한다. 1장, 2장, 3장까지 조금씩 빨라지는 푸너리장단에 맞춰 무녀는 굿을 할 준비를 한다. 무가는 무속 신화인 장편 서사시와 일반 무가로 나뉜다. 장편 서사시에는 세존굿, 심청굿, 손님굿, 제면굿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마수장단에 무가를 부른다. 무속 신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굿에서는 청보장단을 사용하는데 무녀는 점차 빨라지는 장단에 맞춰 무가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5장까지 굿을 한다. 그 외 부정굿에는 부정장단을 연주하고, 세존굿에서는 삼오장장단에 춤을 춘다. 스님타령을 부를 때는 자삼장단을 연주한다. 꽃노래, 뱃노래, 등노래굿에는 삼공잽이 장단을 연주하고 초롱가를 부를 때는 배기장을 연주한다. 거무장단은 무녀가 춤을 출 때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잡귀를 물리는 수부치기에는 수부채 장단을 연주한다. 무악은 한 장단이 1장에서 3장, 또는 5장까지 나뉘면서 다양하게 변주되는 것이 특징이다. 단오굿의 타악 장단은 정교하면서 즉흥성을 내포하고 있어 높은 예술성을 보여 준다. 또한 장구잡이는 가성을 지르는 바라지로 무녀의 굿을 응원한다. 춤은 주로 소도구와 의상에 따라 분류한다. 쾌자 자락을 들고 추거나 부채와 수건을 들고 추는 춤이 가장 보편적이다. 잡귀를 물리칠 때는 신칼을 들고 어포를 들고 출 때는 강신의 의미가 있다. 세존굿에서는 바라춤을 추고 심청굿이나 손님굿에는 손대를 들고 신을 청한다. 송신을 할 때는 꽃이나 초롱등, 탑등을 들고 춤을 춘다. 춤사위는 무관이라고 하는데 손동작과 발동작을 엮어서 구성한다. 돌머리무관, 소신무관, 겨드랑무관, 도리깨무관, 비빔무관, 까불무관, 나비무관, 갈매무관 등이 있다. 관노가 공연했던 가면극은 조선조 패망으로 중단되었던 전승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단순한 장단과 춤사위로 구성되었다. 악기 편성은 호적과 꽹과리, 징, 북, 장구이고 장단은 일채, 이채, 삼채, 자진이채, 질꼬내기, 꺾음쇠, 사채, 서낭굿, 굿거리, 인사굿이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단은 삼채와 굿거리다. 춤사위는 배역의 성격과 상황을 보여 주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의의 및 가치
강릉단오제는 오랜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는 전통축제이다. 강릉단오제에서 모시는 신격을 보면 뚜렷한 지역성이 드러난다. 대관령국사성황인 범일국사와 대관령국사여성황인 정씨여인은 모두 강릉 출신의 인격신이다. 범일국사는 선종의 대가로 강릉지역의 정신적 지도자였고 반면 정씨여인은 호환에 간 비극적인 인물이다. 위대한 지역의 인물을 신으로 모셔 공동체의식을 다지는 동시에 축제를 통해 역사에서 실패한 인물의 아픔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휴머니즘을 갖고 있다. 유교식 제례와 무당굿으로 의례를 하고 불교의 승려를 공동체의 신으로 모시며 산신제를 통해 도교를 습합하고 있는 강릉단오제는 영향력 있는 전통시대의 모든 종교가 공동체를 위해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당수 전쟁에서 종교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때 특별한 가치가 있는 축제이다. 강릉단오제는 강릉지역사회의 발전상을 반영한다. 농민 중심의 봉건사회 축제가 중앙시장 상인이 주축이 되어 일제강점기에도 축제를 이어간 것은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습무가 주관하는 무당굿은 무악, 춤, 무속신화, 연극이 총망라된 종합공연예술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가면극은 강릉지역 서낭신앙이 극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민중의 소박한 심성이 반영된 가면극은 오늘날 강릉단오제에서 가장 많은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기있는 종목이기도 하다. 전통을 잘 수렴하면서 지금까지 활발한 전승을 보이고 있는 강릉단오제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문화 전승의 교육현장이자 통로로 기여하고 있다.
-
지정사항
국가 무형문화유산(1967)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2005)
-
고문헌
허균, 「대령산신찬 병서」, 『성소부부고』 권 14 문부 11.
-
참고문헌
강릉문화원, 『강릉단오제 백서』, 해람기획, 1999. 강릉문화원, 『강릉단오제 원형 콘텐츠』, 강릉문화원, 2006. 김선풍, 『강릉단오』, 열화당, 1987, 농택성 『증수임영지』, 강릉고적보존회, 1933. 황루시, 『강릉단오제』, 강릉시, 1994,
-
집필자
황루시(黃縷詩)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